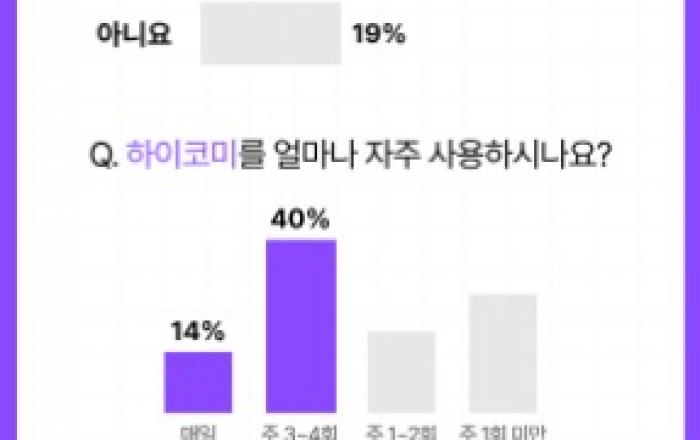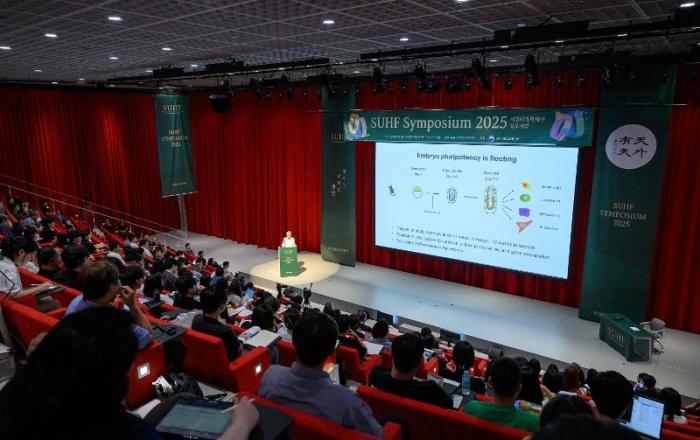드레싱을 끝냈다. 보건일지에 적으며 묻는다.
“몇 학년 몇 반이야?”
“네~ 2학년 3반이요”
“응~ 2학년 3반?”
“아뇨 2학년 3반이요!”
“그래 2학년 3반!”
“아니요~ 2학년이라니까!”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종이에 적어보도록 했다. ‘1학년 3반’으로 적혀있다. 아뿔싸! ‘ㄹ’ 발음이 안 되는 아이였구나!

‘어라? 얘가 또 발음이 안 되네?’ 바로 교정심리 발동!
“아~~해봐” 혓바닥의 모양과 길이를 체크한다.
“혓바닥 위로 올려봐!” 설소대 이상 없고 부정교합 없고…
이 오지랖쟁이 보건교사는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발음 교정에 돌입한다. 혀 끝을 어디에 놓고 발음을 해야 하는지 나의 혀 모양새를 보여주며 ‘일~’을 따라 하도록 하고, ‘일’ 소리가 제대로 나오자 ‘일’과 ‘학’을 따로 떼어 연습 시키고…, 점점 두 음절의 시간 간격을 좁혀 연습 시켰다.
아, 성공과 뿌듯함!
“그거 봐, 연습하니까 되지? 이제 연습 계속해! 발음이 안 좋으면 네가 덜 멋지게 보일 수 있거든.”
그러면서 생각한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못 지나가지?’
또 하나, ‘ㅅ’ 발음이 새는 것을 보면 교정 욕구를 참을 수가 없다. 어찌 된 일인지 요즘엔 리포터나 심지어 기자들에게서조차 심심찮게 튀어나오곤 한다. 물론 이런 아이들이 보건실에 오면 여지없이 나의 ‘교정 타겟’이 되곤 한다.
언어의 소리도 아이들의 모습을 규정 짓는 하나의 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임을 잘 알기에,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은, 아니 적어도 나를 거쳐 간 ‘내 아이들’은 멋진 청소년이 되길 원한다. 발음의 경우는 선천적·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습관에 기인하기 때문에 아직 교정이 가능한 어린 연령일수록 더더욱 쉽게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보건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반듯하고 늠름하게 자라나고 또 더 나아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닌 멋진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성적에만 치우친 교육 현장에서 전인교육은 무너지기 일쑤이지만, 나는 늘 지향하고 또 실천한다. 전인교육을 넘어선 ‘전인 간호’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건실을 방문하는 짧은 순간에도 눈앞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적·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스캔 할 수 있는 ‘매의 눈’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본다. 인간의 내면까지도 파악하고 중재하는 ‘전인 간호’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발음 교정 교육은 사실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중재 행위였던 것이다!
물론 연일 밀려드는 아이들 상처를 치료하랴, 보건 수업에 틈틈이 공문서까지 처리하랴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이 또한 나의 직업이 주는 보람찬 즐거움임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낸다.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의 작은 수레바퀴를 굴리며!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희진 서울지향초등학교 보건교사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